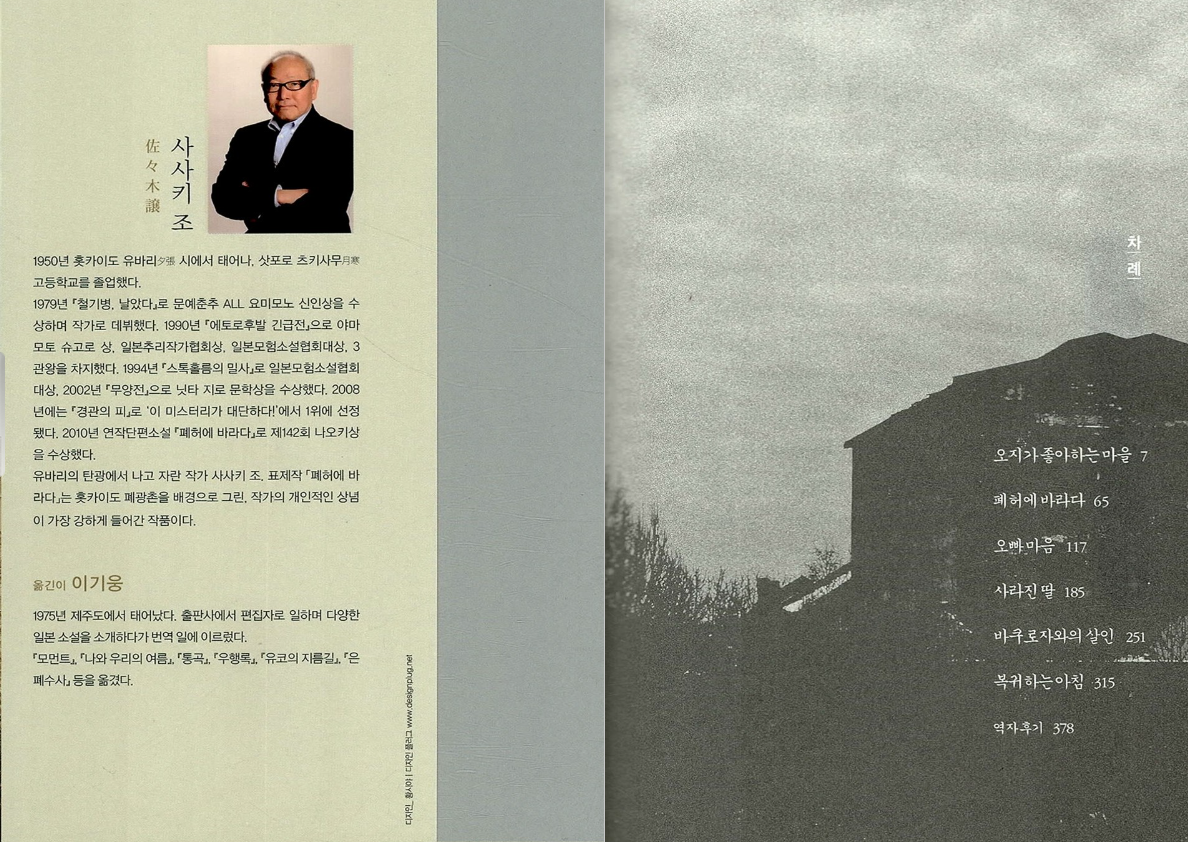유명한 명탐정들의 활약
셜록 홈즈, 에르큘 포와로, 미스 마플, 샘 스페이드.
추리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 독자라도 그 이름은 한번씩은 들어봤을 명탐정들이다. 물론 이름을 언급한 저 탐정들은 소설 속 가상인물들이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탐정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공인탐정, 민간조사원(PIA: 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등으로 불리며 합법적인 활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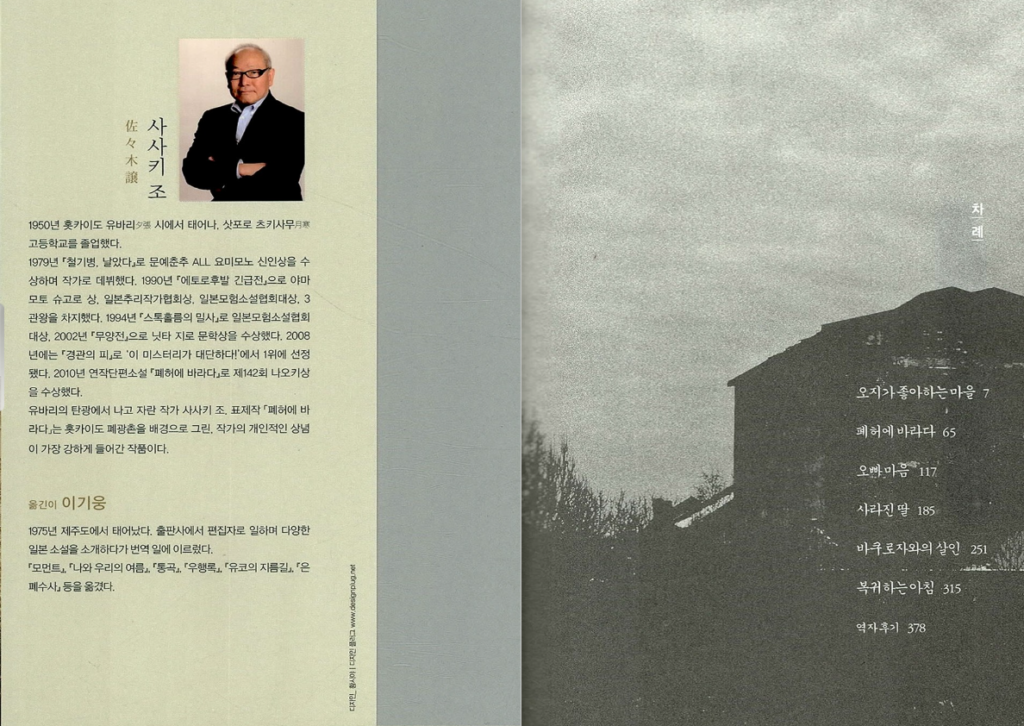
일본의 탐정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추리소설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웃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은 탐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왔었는데, 사실은 탐정업에 대하여 특별한 국가적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탐정업을 운영 –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탐정업의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탐정업의 규제를 위한 입법화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2006년 6월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외회를 통과되면서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사설(私設) 탐정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공인(公認) 탐정은 일본에서도 최근에서야 등장하게 된 것이다 – 물론 기존 사설 탐정들도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니 국가 공인이라 봐도 큰 오류는 없겠지만 -. OECD 국가 중 탐정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 우리나라도 2008년에 ‘민간조사제도'(일명 탐정) 도입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 라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기껏해야 바람난 배후자 뒷조사나 가출한 가족 찾기 정도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고작이니 멋진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소설들은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허구(虛構)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제142회 나오키상 수상작이자 경찰 소설의 베테랑 작가라는 사사키 조(佐佐木讓)의 단편집 <폐허에 바라다(廢墟に乞う/북홀릭/2010년 11월)>이 그동안 내가 읽어본 여느 일본 추리소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6편의 단편작 소개
책에는 표제작인 <폐허에 바라다>를 포함해서 총 6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전반적인 줄거리
‘폐허에 바라다’에서는 주인공인 훗카이도 경찰본부 소속 형사인 센도 다카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자택 요양 명령을 받아 4주에 한번 씩 지정된 심료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담당의가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그런 상태가 벌써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증상이 개선됐고 충분히 건강해졌으니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혀왔지만 아직도 경찰 인사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센도에게 과거 동료 형사들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 알음알음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오고, 휴직 상태라 수사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없지만, 그저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의뢰를 받아들이고는 사건이 발생한 훗카이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가 의뢰받은 사건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건들인 외국인 범죄, 상해치사, 여성 납치 성폭행 및 실종 사건 등으로 센도 또한 번뜩이는 두뇌회전이나 초능력처럼 느껴지는 직관력이 아니라 형사들의 기본 수사방법인 사건 현장 조사, 주변 인물들의 탐문과 알리바이 조사 등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다. 그러나 휴직 상태라 실제 수사권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인 센도로서는 그를 경계하는 지역 형사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담당 수사관이 아니란 이유로 주변 인물에게 증언을 거부당하기도 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자신 또한 기존 수사 허점과 새로운 정황 증거, 범인 추정 인물에 대한 힌트를 담당 형사에게 일러주고는 사건 결과를 미처 보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며 자신의 복귀가 이번 사건들 때문에 갈수록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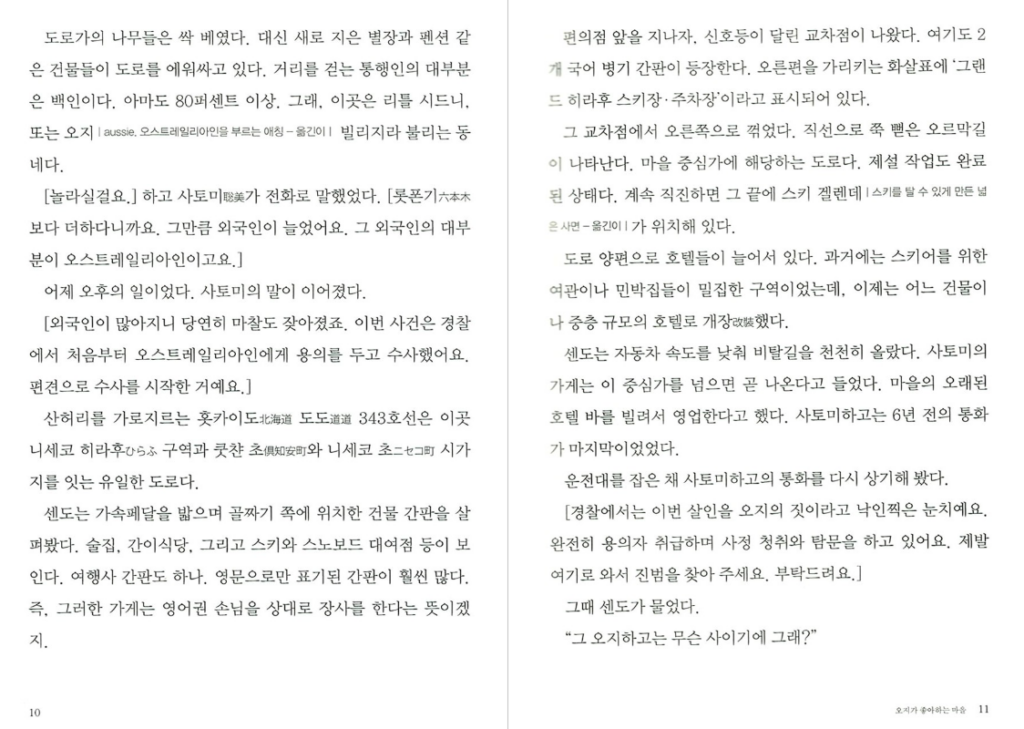
‘복귀하는 아침’ 내용 요약
폐허에 바라다의 마지막 편인 <복귀하는 아침>에서는 심료치료 의사로부터 다시 요양을 명령받고 한적한 시골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던 센도는 더 이상 현장 복귀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오던 중 3년 전 삿포로 사건에서 알게 된 여인에게 의뢰를 받고 오비히로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각 단편마다 잠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그를 휴직에 처하게 했던 과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 연계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폐허에 바라다’ 책에서는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평범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그 해결도 형사들의 기본 수사 방식인 현장조사와 탐문에 의해 해결되며, 뛰어난 두뇌회전과 범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명탐정이 아닌 과거 사건에 의해 고통 받는 평범한 수사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동안 많은 일본 추리소설들에서 볼 수 있었던 절묘한 트릭이나 기막힌 반전을 기대하고 읽은 독자들이라면 실망감이 들 정도로 재미 면에서는 밋밋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그런 면이 더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느껴져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작가 특유의 문체(文體)인지 아니면 번역가의 솜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을 장황하게 길게 늘여 쓰지 않고, 짧게 끝을 맺는 단문(短文) 위주여서 꽤나 속도감 있게 읽혀져 400 페이지 가까운 책을 금새 읽게 만든다. 그동안 읽어본 많은 일본 추리소설들 중에서 손꼽을 만한 걸작이라 평할 수 는 없겠지만 부담감 없이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추리소설 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